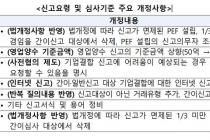- 0
- CoinNess
- 20.11.02
- 11
- 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여성의 소득이 2배 증가하면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망설이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개발원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남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소득에 대한 1.04로 남성 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자녀수는 약4% 증가하는 것으로 여성소득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작년 기준 맞벌이별 자녀 수는 비맞벌이 가구가 1.46명으로 맞벌이 가구 1.36명보다 자녀 수가 많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 자녀 수에서도 미취업여성 가구(1.48명)가 취업여성 가구(1.34명)보다 자녀 수가 많았다.
25~44세 전체 유배우 여성집단을 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은 1~3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적으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많다.
5분위 고소득 가구의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소득 젊은 연령 집단에서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점이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유배우자 여성 25~44세 전체 연령대에서는 2003년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과 2023년도에는 소득과 자녀 수가 'V자'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소유 여부 변수에서는 주택소유가 주택 미소유에 비해 자녀수를 6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자녀 출산 시기에 여성이 비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이 일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여러 지적이 있으므로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단절이 아닌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여성의 고학력 수준이 과거에는 출산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여성의 커리어 획득을 위해 양육의 분담이 당연히 돼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시스템 또한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급등주 지금은] '8연상 신화' 태양금속우를 아시나요](/files/thumbnails/501/873/003/75x50.crop.jpg?t=1664057410)
![[급등주 지금은] '8연상 신화' 태양금속우를 아시나요](/files/thumbnails/501/873/003/210x140.crop.jpg?t=1664057411)



































![[올댓차이나] 중국 증시 혼조 마감…상하이지수 0.55%↓](/files/thumbnails/270/227/005/75x50.crop.jpg?t=1718611209)
![[올댓차이나] 중국 증시 혼조 마감…상하이지수 0.55%↓](/files/thumbnails/270/227/005/210x140.crop.jpg?t=171861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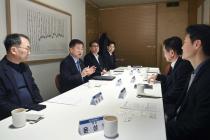








![[올댓차이나] 중국 증시 하락 출발…상하이지수 0.49%↓](/files/thumbnails/055/227/005/75x50.crop.jpg?t=1718589612)
![[올댓차이나] 중국 증시 하락 출발…상하이지수 0.49%↓](/files/thumbnails/055/227/005/210x140.crop.jpg?t=171858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