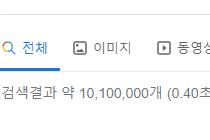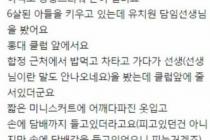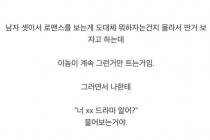- 0
- 익명
- 924
- 0

건빵 —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섭취하던 밋밋하고 딱딱한 비스킷
왼쪽부터 차례로 - 고대 이집트군의 '두라'(dhourra cake), 로마군의 '부캘럼'(buccellum), 리처드 1세 십자군의 '무슬린의 비스킷'(biscuit of muslin), 영국 해군의 '쉽 비스킷'(ship biscuit), 아메리카 합중국 육군의 '하드택'(hardtack), 일본군의 '칸판'(kanpan), 러시아 해군의 '갈레타'(galeta), 하와이 주민의 '크래커'(cracker), 탐험가들의 건빵.
서양의 Hard Tack이 건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온 것은 일본의 근대기에 일본 육군에서 만든 건면포(乾麺麭, 면포는 빵을 뜻하는 한자어)라고 한다. 일본 육군이 처음에 비상식량으로 서양식 건빵을 도입했다가 병사들의 엄청난 불만에 직면했고, 이후 병사들의 기호에 맞추는 과정에서 개량되어 원판과는 달라진 것. 별사탕 역시 일본식 건빵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다. 자위대에서는 지금도 전투식량으로 건빵이 지급된다.
그러다가 일본의 제과점에서 일하던 한국인 제빵사 이순택 씨가 건빵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해방 이후 민간인에게 판매한 것이 인기를 끌자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공급되어 건빵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이순택 씨가 북한군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북한 조선인민군에다 강제로 건빵을 공급하다가 대한민국 국군에게 구출되면서 다시 건빵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 조선인민군도 건빵이 있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장병 1인당 하루 1/3봉지인 80g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위해 사단 별로 건빵을 만들어서 지급했다. 증식이라기 보다 주식에 가까웠다. 1952년 초부터는 서울에 건빵공장이 세워져서 한국군의 수요를 충당하였다. 당시에는 실탄의 은어이기도 했다.
한국에 건빵을 처음으로 알린 건 1920년 한국 최초의 양과자점 메이지야(明治屋)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광역시 북성로 미나카이 백화점 옆에 있던 이마사카(今阪) 제과점 종업원 출신 진병수 사장이 창립한 수형당(秀亨堂)에서 한국인 주도로는 최초로 건빵을 팔기 시작했다. 한국군 창설 초기, 일본군 출신 한국군 고위 장교들의 주도로 건빵이 한국군의 전투식량이 되었으며 각지의 제과점이 이를 납품하며 성장하였다. 특히 그 중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이 해태제과이다.

서양판 건빵인 하드택(Hardtack)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 시대로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듀우라(Dhourra)라는 이름의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과자류를 항해용 보존식으로 사용했는데, 이 과자빵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람세스 2세인 걸로 봐서 적어도 이 때부터는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빵기술은 로마로 넘어가서 개량되었는데, 로마인들은 이 과자빵을 두 번 구워서 수분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존기한을 극단으로 늘렸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2번 구운 빵을 싸구려 작은 빵이라는 뜻의 부클럼(Buccellum), 혹은 두 번 구운 빵이라는 뜻의 빠니스 비스-콕투스(Panis Bis Coctus)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름이 Biscoctus -> Biscocti -> Biskit -> Biscuit으로 변화한다. 지금은 과자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적어도 14세기 중세 영어까지는 비스킷이 서양식 건빵을 뜻했다는 것이다.
맛보다는 장기보존을 가장 중요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빵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스트 등 기타 재료 없이 밀가루와 소금, 물만 이용했다. 서양의 주식인 빵만 해도 저장 방법에 따라선 보존기간이 길어 보존식으로 쓰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 서양식 건빵이 빵을 밀어내고 항해용/군용 보존식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극단적으로 쉬운 제조방법 때문이었다. 빵은 효모를 넣고 며칠간 발효를 시키는 등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지만 건빵은 밀가루를 적당히 반죽해서 포크 등으로 구멍을 낸 후 두 번 굽기만 하면 되니까, 생산단가와 생산량에서 압도적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부패를 막기 위해 수분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서너번 이상 구워내는 것이 기본인데, 보관설비마저 좋지 않아 그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 벽돌처럼 단단해져서 도끼 같은 연장을 쓰지 않으면 절대 쪼갤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판금 비스킷(Iron Plate Biscuits)이라거나 이빨 파괴자(Teeth Duller), 철판 크래커(Sheet Iron Cracker), 시멘트 판(Cement Plate) 같은 단단하게 들리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별명이 붙었다.

당연히 그냥 먹으려다가는 이가 나갈 판이라, 보통은 차나 커피 같은 음료에 푹 담가서 연하게 불려 먹거나 돼지고기(염장고기)와 함께 물에 넣고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혹은 물에 개서 유지와 소금 등을 첨가한 다음, 팬케이크처럼 만들어서 먹었다고도 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엔 그나마 불을 피울 수 있는 환경에서 건빵을 마대 자루 등에 담고 물을 뿌려 땅에 묻고 위에다 불을 피워 뜨겁게 만든 후 다시 파내서 먹는 조리법까지 생겼을 정도.
하여튼 사람이 평범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 딱딱한 물건을 짱돌로 찍어 부수어 가면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애써야 했다. 어느 정도냐면 깨물었더니 튕겨져나가서 반합에 부딪쳤는데 그야말로 쇠와 쇠끼리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가 났다고 하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돌에 내리쳤는데 돌이 부서졌다는 괴악한 이야기도 나돌 지경.
남북전쟁 때도 남북 양군의 군용식량이었는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이딴 게 식량이랍시고 내려오니 이 맛대가리라곤 전혀 없는 것을 허구한 날 먹던 장병들은 갈수록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허구헌 날 맛없는 것을 먹었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인들 기준. 당시 북군 짬밥은 나름 고급이었다.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조리하다 보니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한들 맛이 팍팍 죽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만... 그래도 아침은 빵, 커피, 베이컨이었고, 점심은 커피, 베이컨, 빵이었으며 저녁은 베이컨, 빵, 커피라는 규칙적 병영식이 제공되었다
댓글 0